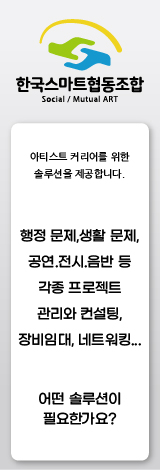아마추어 등반가 장재현 |
*** (편집자 주) 이 글은 지난 5월 22일 아마추어 등반가인 장재현씨의 설악산 등반 기록이다. 암벽 등반은 일정한 거리를 올라가거나 내려와서 절벽에 몸을 고정하고 장비를 정리한 뒤, 다시 일정한 높이를 오르거나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본문에 나오는 '네 번째 마디'라는 말은, 이런 행동을 네 번째 반복하게 될 암벽을 말한다. '볼트'는 등반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자일을 걸 수 있는 고리를 말한다.

설악산 토왕골 동쪽에 '솜다리의 추억'길이 있다. 네 번째 마디 아래 선다. 낡은 슬링이 볼트마다 매달려 바람에 흔들거렸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다가서는 등반 중 빗방울이 떨어져 차라리 잘 됐다 싶었으나 초여름 침봉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대기의 장난에 지나지 않았다.
볼트 두 개를 걸고 내려왔다. 동작은 가늠되지만 새가슴인 내게 그 정도를 감당할 담력이 있을 턱이 없다. 이어 우리가 따라온 <오아시스 산악회>의 정예가 붙었다. 동작을 보니 5.11급이다. 애초에 내가 붙을 데가 아니었다. 후등조차 만만치 않았다.

이 루트 안쪽 '별을 따는 소년들'에 붙은 일행들 앞 뒤로 "출발", "줄 당겨", "확보 준비 완료", 호쾌하게 외치는 등반 구호가 끊이지 않고 앞뒤로 오간다. 눈 높이 바로 아래 허공이 갑자기 시끄러워 보니 새호리기인가 싶은 맹금 두 마리가 터 싸움을 하는지 얽혔다 떨어졌다 곡예 비행을 한다. 이쪽 저쪽 능선에서 들려오는 등반자들의 외침 따윈 안중에도 없다.

노랗고 빨간 옷이 몇 해 전부터 유행이라 토왕골 건너편 노적봉에 이르는 '4인의 우정길'에 붙은 두 팀이 눈에 확 띈다. 그런 옷차림이 아니면 소외감을 느낄 만한 쓰나미 같은 이 유행도 몇 해 지나면 촌스러운 패션으로 전락할까?

먼 데서 봐 더욱 그렇지만 어기적거리는 사람의 등반 속도라는 게 공중을 나는 새나 심지어 곤충에게 위협이 될 리 없다. 가장 높이 허공에 맞닿는 금이 우리에게 등반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연다면 가장 깊은 계곡이 그들에게 공포의 지대일 수 있겠다. 우리는 그들의 계곡에서 열락을 맛보고, 그들은 우리가 땀을 씻는 계곡에서 서늘함을 맛본다. 허공의 위태로움은 그들의 자유, 지반의 단단함은 우리의 안온이다. 나의 능선은 너의 골짜기, 너의 능선은 나의 골짜기가 아닌가?

솜다리봉 꼭대기에서 하강 두 번째 마디, 오버행 밑에 숨어 있는 다음 하강 포인트를 찾지 못해 허둥거렸다. 오십 미터를 넘은 하강에 외줄이 일 미터 넘게 출렁거렸다. 겨우 왼쪽 위로 클라이밍하여 횡단하고 나서, '등강기를 로프에 달고 갔기에 망정이지' 하고 숨을 고르며 안도하였다.
집에 와 보니 지방선거 홍보물이 와 있다. 봉투를 뜯자 쏟아지는 건 잡다함 그 자체였다. 내용과 형식을 고루 넘나드는 일관성의 경지에 이른 잡다라니. 그 잡스러움이야말로 정치의 비옥한 서식처임을 주요일간지의 종이로서 운명이 증명한 지 오래지만 집까지 내처 쳐들어오다시피 한 인쇄물은 확실히 새로웠다. 나는 능선에서 가장 낮은 골짜기로 다시 내려온 것인가.

하루 지난 오늘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열세 번째 주기다. 그가 가고 나서 숨을 겨우 가라앉히고 쓴 소회를 다시 꺼내 본다.
<송가>
후드득
이슬 하나
흰배지빠귀 울음소리에
굴러내렸을지도 모른다
푸드득
푸른 새벽 공기
짙어 가는 우듬지 위로
출렁거렸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허공을
막
내딛던
그 순간
당신이 내게 올 때는
나는 몰랐다
당신이 아주 돌아섰을 때에야
나는 알았다
사람의 존엄,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 사람의 존엄, 그것은
다른 한 사람을 존엄으로 대하는 일
그 위도, 그 아래도 아님을
이제 나는
마음대로 생각할 수 없다
당신은 내게
너무 높은 도덕이므로
이제 나는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다
당신은 내게
너무 큰 용기이므로
내려오는 길에도 솜다리가 피어 있었다. 날이 갈수록 부푸는 대기가 낮 내내 볕을 흩어 뿌연데 솜다리의 꽃받침은 날씨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솜을 누빈 듯 도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