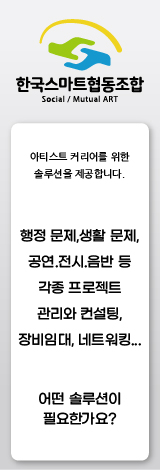미술평론가 최석태 |
‘박생광’이라고 하면, 그 이름이라도 아는 사람은 탱화 같은 그림을 그린 분이라고 한다. 탱화라면 절에 걸려 있는 그림을 가리킨다. 절의 이런저런 건물 안에 걸린 채색이 짙은 그림들과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여겨서 나오는 반응이라고 여겨진다.

흔히 접하는 한국화, 이른바 전통 회화가 아직 대부분 선이나 농담이 먹으로 그려진 위에 옅게 채색이 곁들여지는 것이 대부분인 상태다. 그에 비하여 박생광의 그림은 짙은 채색이 넘쳐흘러 너무나 다른 느낌을 준다. 채색이 넘쳐흐르는 것에 더하여, 넘쳐흐르는 채색을 붉은 선들로 둘러쳐서 색채감을 더욱 높여준다.
돌이켜보면 일본 강점기에 강요되다시피한 분위기 속에서 그려지던 일본식 채색화에 광복 시기에 반작용이 강하게 작용하여, 한국화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먹 위주의 그림이 대세를 차지했다. 좀 과장하자면, 여성인 천경자에게만 채색화가 허용되는 분위기였다. 박생광도 예외는 아니라서, 어정쩡한 자세를 보였다.
박생광의 진한 채색화는 이런 분위기에서 놀라운 제안이었다. 그러면 박생광의 특징이 된 진한 색채의 그림은 언제 처음으로 선보인 것일까? 1979년 6월에 서울에서 열린 제2회 중앙미술대상전의 초대에 응해 출품한 <신기루>라는 그림이 그 시작이다. 그의 나이 75살 때이다. 그는 1904년에 태어났다.
박생광의 그림은 일종의 색과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치 이런저런 색종이를 오려 붙인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색채감은 오늘날은 흔한 것이 되었지만,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먼저 그림을 살펴보자. 화면이 좀 어지럽다 할 정도로 복잡한 가운데 그림의 중심 소재는 소를 타고 가는 여인과 그를 따르는 남자이다. 그 주위로 해와 백학이 윗부분을 차지하고, 커다란 사슴이 인물들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소의 다리 아래로는 달이 배치되었다. 화면 맨 아래에는 일월곤륜도에 보이는 물이 출렁이는 가운데 십장생의 목록에 나올만한 소재들이 등장한다. 무언가 상서로운 분위기의 그림이다.
그러나 이 그림은 실패작이다. 좋은 소재를 다루었다고 해서 좋은 그림이 되는 것이 아니다. 대체로 그림은 소재들이 어지러울 정도로 두서없이 나열된 느낌이다. 특히 그림 아랫부분은, 심하게 말하면 거의 쓰레기로 찬 강가 같다.
그러므로 이 그림은 실패작이다. 그 실패는 그러나 찬란한 실패다. 그는 이 그림을 그리자마자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자신을 포함해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시도를 한다. 그런 시도의 결과 바로 오늘날 ‘박생광’ 하면 떠오르는, 짙은 붉은 색 띠가 둘러쳐진 화풍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박생광은 <신기루>의 주요 소재와 인물들을 어떻게 떠올렸을가? 그가 이 소재를 알게 된 것은 분명 1978년 5월 이후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전의 인터뷰나 작품에서는 이런 소재가 전혀 등장하거나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70년대 후반에 흔히 민화라고 부르는 우리 옛 그림을 모은 한 권의 화집이 출간되었다. 우리 미술에 대한 상당히 방대한 화집의 하나로 그 후에도 여러 해에 걸쳐 모두 24권으로 간행된 전통 미술 서적인 <한국의 미> 전집 중 하나였다. 이 민화집은 그 당시 꽤 관심을 모았다. 이 가운데 박생광의 그림과 공통점을 보이는 그림이 있다.

이 그림을 본 박생광은 전율했던 것 같다. 자신의 미술 작업이 가고자 했던 방향, 이루었으면 하는 경지가 이미 옛사람들이 이루고 있지 않은가? 그는 이 그림 하단에 있는 다음과 같은 한 장면에 꽂힌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낙원을 그린 행복한 마을의 아랫부분에 있는 이 부부상을 써먹기로 하였고, 이를 주요 소재로 하고 여러 가지 요소를 덧붙여 한 점의 그림을 완성했다.
그림은 지어미와 그들의 아이를 아끼는 지아비, 지아비의 배려에 행복해하는 지어미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여겨진다. 이를 신비한 현상으로 여겼을까? 박생광은 이 그림에 ‘신기루’라는 이름을 붙였다. 첫 <신기루>의 부족한 점을 보완한 그림은 거듭 그려졌고, 신기루 연작이라고 할 그림들을 거듭 그렸다.

박생광이 처음 신기루라고 할 어떤 경지를 본 때가 그의 나이 75살이었던 1978년이다. 이후 불과 10년이 안 된 1985년에 생을 마감하기까지 그를 불타오르게 한 것은 그가 들여다본 바로 그 어떤 경지가 아니었을까? 바로 그 경지가, 우리의 과거에서 캐낸 바람직한 것을 붙잡고 노경(老境)의 씨름을 피하지 않은 까닭이 아니었을까?
삶의 의욕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만이 조상 대대로 해오던 것을 존중하며 그 속에서 이어갈 것이 무엇인가를 내내 고민하던 사람만이 잡아낼 수 있었던 신기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