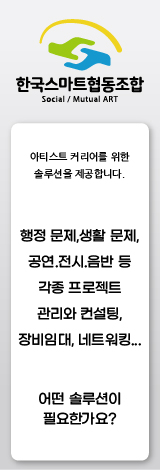장터에 가면 호주머니 속에 숨어있던 고향이 사람들 틈 속에서 걸어 나온다. 이른 아침부터 보따리행렬은 생활을 진열하기 위해 장터 속으로 들어온다. 농산물을 가지고 장에 나오는 사람들 모습은 비장하다. 좋은 가격에 농산물을 넘기려는 사람들 표정이 활시위처럼 팽팽하기만 하다. 작은 경제가 일어서는 모습이 장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인네들의 보따리 속에는 자녀들의 꿈과 희망이 숨어있다. 여인들에게 땅은 보물창고다. 온갖 씨앗에 비밀을 담아 봄이 되면 보물창고에 시간을 심어 넣는다.

바람소리와 풀소리 그리고 물소리마저도 비밀이 되어 땅속에서 만나게 된다. 여름 내내 밭을 매면서 호미끝자락에 비밀을 묻어놓아 가을이 되면 캐내는 것이다. 드넓은 땅에 콩등을 심어 놓고도 어느 밭에서 순이 제일 먼저 돋아나고, 어느 농작물에 마지막으로 해가 스며드는 것까지 알고 있다. 장날이면 자연도 보따리에 숨어 장터까지 따라 나온다. 장터란 이렇게 땅이 있어 장이 서는 광장이다.

장터에 가면 고향의 냄새와 맛, 소리와 감촉까지 느낄수 있다. ‘손주놈 오면 줄라고 넉달동안이나 시렁에 매달아 놓았는디, 손주놈은 안오고, 돈도 아쉽고 해서 장에 갖고 나왔는디 맛좀보시랑게 잉, 맛있제이?’ 곶감을 팔러 나온 할머니다. 이렇듯 장터에는 그 지방 사람들의 생활이 고스란히 살아있다.
장터를 찾아다니다 보면 인간적인 면을 수없이 경험하게 된다. 장꾼이 아닌데도 가지고 나온 물건은 빈자리만 있으면 펼쳐놓는다. 이 물건들은 지난 5일 동안 장터나들이를 위해 마련해 놓은 것들이다. 그래서 잘 차려 놓은 좌판보다는 길모퉁이에서 흥정하는 것을 즐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중심은 사람이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장터이고, 모든 것은 장터로 통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물결은 장터에서 잠시 멈춘다. 돈보다 귀한 사람의 정(情)이 보따리마다 숨겨져 있어 사람들은 장터로 몰린다. 지금도 손수 농사지어 갖고 나온 가지2개와 당근 몇 개를 길 한쪽에 펼쳐놓고 질펀하게 앉아 사람들과 이마를 맞대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장에 나온 사람들 얼굴을 보기위해 앉아 있는 할머니를 네모 안으로 들여보내는 시간이다. 네모 안에 갇힌 시간은 언제든 다시 풀어놓을 수 있다. 그리고 물건을 많이 판 사람이나, 조금 판 사람이나, 고르게 떨어지는 햇살은 똑같이 따뜻하기만 하다.

오백 원 하는 무 하나를 사고, 팔 때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얼굴을 맞대며 고추농사를 걱정하던 노인들은 국밥집에서 마시는 막걸리잔 위에 걱정을 부려놓기도 한다. 집에서 기르던 닭 한 마리 판돈으로 손주 놈 운동화 한켤레 살 수 있는 곳이 장터다.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와 농로에서 잡은 미꾸라지 한 그릇을 가져온 할머니는 생산자이면서 판매자가 되는 곳도 장터다. 난전을 펼쳐놓고 장구경을 다녀도 주인 없는 물건에 손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 장터마당이다. 집에서부터 할머니 보따리를 따라 나온 정(情)은 덤이 되어 사람들 보따리 속으로 들어가는 곳 또한 장터다.

인터넷에는 없는 인간관계가 생겨나 상업과 문화가 만나는 곳이다. 상주(喪主)한테 첫마수를 해 물건이 동티나게 팔렸다며 길 마담을 불러 커피 한잔씩 돌리는 장돌뱅이가 담벼락 속에 숨어있는 고향과 손잡는 시간이다. 이것은 시골장터에서 맛보는 정겨움이다. 장터라는 공간 안에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은 여인네들의 입소리(口音)다.
내가 만난 할머니얼굴에서 아쟁소리가 들리고, 또 다른 얼굴에서는 남도의 육자배기가 들린다. 자연과 흙과 나무에서 흘러나온 푸르디푸른 이야기가 할머니 얼굴에 숨어 있어 지금도 각 장터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사물들이 눈을 뜨고, 말을 걸어오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색(色)으로 들릴 때 중간에서 시간을 잘라내는 놀이를 했다. 멈춘 시간이 역사로 남아있기에 지금도 장터를 찾아 나서고 있는 것이다.

농촌이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골장터가 쇠퇴해져간다는 이야기는 장꾼들을 통해 듣는다. 유통시장이 개방되고, TV홈쇼핑과 인터넷쇼핑으로 인해 오일장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IMF외환위기로 인한 실업자들은 장터로 몰려 장에 나오는 사람보다 난장을 펼쳐놓은 장꾼들이 더 많은 경우도 있다. 장터에서 내는 장세는 200원에서 4,000원이다. 장에 도착해 눈독 들였던 난전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아귀다툼은 어느 장에서나 일어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1914년 일제강점기때 일본은 면소제지에 시장을 1개씩 개설하라는 시장규칙을 공포하였다. 우리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일본의 횡포였지만 재래시장을 확산시킨 긍정적인 면도 있다.

시골장터를 찾아 다니다보면 면소재지에 서는 장이 없어진 곳도 많이 있지만, 마을주민들이 나와 장터를 지키고 있는 곳도 있다. 장이 이미 폐쇄 되었는데도 난장을 펼쳐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반평생을 장터에서 살았는데 장은 없어져도 장바닥은 남아 있다며, 사람이 있는 한 장에 나온다는 할머니도 있다. 장터에는 우리의 삶이 살아있고, 우리가 만들어낸 시간이 살아있어 고향에 온 경험을 하게 된다.

수천 년의 시간이 머무는 이스탄불에는 500년을 상징하는 그랜드바자르라는 세계최대의 전통시장이 있다. 전세계 사람들이 4천개의 상점을 가기위해 65개의 거리와 골목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경제사는 인류최초의 상인이 행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동이 신라에서 마장사를 했다는 설은 삼국시대에도 행상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우리나라전통시장은 17세기말무렵인 18세기초에 전라도 나주에서 장이 처음으로 열리기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옛 장터에서는 남사당놀이와 소리꾼들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판소리공연을 하는등 농민들의 복합 문화공간이었다. 그러므로 시골장터는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에서 벗어나, 경제와 문화가 만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

장터에서 생활의 활력과 문화의 충격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람들이 생계수단으로서의 장터를 넘어, 직접 생산하는 상품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환경의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터의 주인은 농민들이다.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도시인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장터로 활성화시켜야 한다.
오죽하면 ‘장꾼들의 숨소리만이 진짜’ 라는 말이 나돌겠는가. 땅은 모든 생명을 만들어 낸다. 지역농산물로 만들어가는 농민장터가 살아나야 시골장터 또한 살 수 있다. 생활문화의 꽃을 피우는 난장에서 농민이 애지중지 기른 농산물을 사고파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시골장터에 가면 이 시대 마지막 역사의 혼이 살아 있다. 두꺼운 책처럼 펼쳐보면 지혜가 들어있는 말하는 박물관이 시골장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