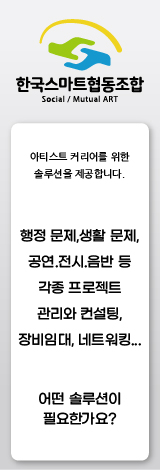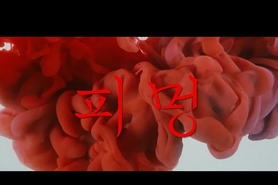미술평론가 최석태 |
지인들에게 이 그림을 본 인상을 물었다. 다들 산만하다고 한다. 맞다. 처음 이 그림을 슬쩍 봐서는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없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분주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 네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

그림의 위쪽에 있는 두 사람은 광주리인 듯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한 사람은 그것을 받쳐 들었고 또 한 사람은 끌고 있는듯하다. 둘은 분명 아이, 그것도 남자아이다.
그림 아래의 둘은 모두 무언가를 붙들고 있다. 오른쪽 사람은 비교적 선명한 몸통의 모양과 붉은 벼슬로 보아 닭인 듯 싶은데, 자세를 보아하니 닭의 발을 잡고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듯하다. 다른 한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들고 있는 흰 물체를 따라가 보면 바닥으로 쭉 뻗은 머리 부분에 붉은 벼슬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또한 닭인듯하다. 이들이 닭을 붙잡고 있는 걸로 보아 위에 있는 광주리 속에는 노란 새끼 닭, 즉 병아리다.
화가는 어린이임에 분명한 위의 두 사람에게 윗도리를 입혔다. 아래의 둘은 옷을 입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 정황이 보는 이를 더욱 헷갈리게 한다. 아래 사람도 어린이라면 그들에게는 왜 옷을 입히지 않았을까? 그저 닭의 색과 옷 색이 같아서 생략한 걸까? 혹시 아래 두 사람은 어린이가 아니라는 의미인가? 그런데 대체 흰 닭은 왜 저렇게 목을 축 늘어뜨리고 저런 모양으로 있는 걸까?

이중섭 사후 1972년 서울 현대화랑에서 있었던 전시의 도록에서 미술평론가 이구열은 이 그림을 <가족과 닭>이라고 하였다. 그는 1976년 『근대한국미술선1』에 이 그림을 실으면서도 <가족과 닭>이라고 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아래 두 사람을 어머니와 아버지로 인식한 것이다.
하지만 1986년 이중섭 30주기를 기려 개최한 전시회 도록에 실은 도판해설에서 작가 유홍준은, 이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 넷 모두를 어린이로 보고 그림의 제목을 <닭과 어린이>로 바꾸었다.
이 도록은 전시 후에 펴내는 사후도록으로 전시회 중에 유홍준이 겪은 이야기가 실려있는데, 이 그림이 어떤 장면인지 알게 된 경위를 밝히고 있다. 전시를 주관한 쪽에서도 이것이 어떤 장면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마침 전시를 보러온 분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한다.
이것은 시골 어린이들이 흔히 하는 장난으로 수탉의 똥구멍에 바람을 세게 불어넣으면 수탉이 발정을 해서 곧바로 암탉에게 달려들어 교미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다만, 사람에 의해 똥구멍에 놀라운 짓을 당한 수탉은 교미 전에 잠깐 기절한다. 그래서 목을 늘어뜨리고 죽은 것 같은 그림의 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유홍준은 그림에 등장하는 네 사람 모두를 이런 장난을 하는 어린이로 본 것이다.
이후 1990년에 금성출판사에서 펴낸 『한국근대회화선집 7』에서도 이 그림의 제목이 <닭과 어린이>로 표기되었다. 애초에 이 그림에 <가족과 닭>이라 이름붙였던 이구열이 이 책의 편저자로 참여하였는데, 본인이 처음에 지은 제목이 아닌 유홍준의 제목을 채택하여 표기한 것이다.
하지만 1999년 갤러리 현대에서 이중섭 전시를 진행할 때 필자는 이 그림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만일 '놀이'가 이 그림의 주제라면, 그리고 네 명 모두 아이들이라면, 닭을 교미시키는 일에 모두가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교미시키는 걸 어깨너머에서 구경이라도 했을텐데 이 그림은 그렇지 않다. 뒤의 두 명은 병아리 광주리에 매달려 있다. 오른쪽 아이가 발에 힘을 잔뜩 주며 버티고 있으니, 왼쪽 아이에게서 광주리를 빼앗으려는 것처럼도 보인다.

그러고 보니, 어른들이 닭을 교미시키는 동안 심심해진 아이들은 병아리라도 독차지하려고 서로 다투는 장면으로 보인다. 그래서 나는 이 그림의 제목을 <닭과 가족>이라고 고쳐서 소개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그림을 <가족과 닭>이라고 고쳐 부르고자 한다. 아무튼 순서는 사람 먼저, 동물은 나중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닭은 그 당시 꽤나 친숙한 동물이었다. 이중섭은 어린 시절을 보낸 평원에서도, 초등학교를 다닌 평양에서도 닭을 접했을 것이다. 1945년 5월에 결혼한 직후부터는 상당한 숫자의 닭을 직접 키웠다고 한다. 어느 날은 닭장에 들어가서 자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닭 이가 올라 꽤 고생했다고 한다. 이런 노력 끝에 건져낸 것이 이 결정적인 장면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웃고 떠들고 알콩달콩 사는 것은, 특히 아직도 이 나라에서는 자주 향유되지 못하는 그리운 풍경이자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림이다. 이중섭이 따로 선명하게 테두리를 그리지는 않았지만, 그림 속 등장인물은 모두 네모틀 속에 들어 있다. 어쩐지 좁은 방 안에서 가족이 정신없이 떠들썩한 느낌이 들지 않는가.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 산만해 보인다고 느끼는 것은, 산만하고 정신없을 정도로 왁자지껄한 가족과의 삶을 그리워하던 중섭의 마음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일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