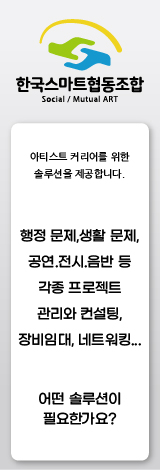뉴스아트 편집부 | 2025년 여름, 한국 만화계에는 두 개의 상징적인 사건이 교차했다. 하나는 법정에서 들려온 뒤늦은 정의의 선언이었다. 법원은 故 이우영 작가의 유족이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되찾고, 오히려 출판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른 하나는 거대 플랫폼의 차가운 회신이었다. 웹툰작가노동조합(이하 웹툰노조)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보낸 단체교섭 요구서에 대해, 회사는 "당신들은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교섭 테이블 자체를 부정했다. 이 두 사건은 K-콘텐츠의 화려한 명성 뒤에 가려진, 비정한 민낯과 구조적 모순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되풀이되는 비극: 계약서라는 이름의 '종신형'
故 이우영 작가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은 종이 몇 장으로 이루어진 계약서였다. 그 안에는 '원저작물 및 파생된 모든 2차 사업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기한조차 명시하지 않은 채 창작자의 미래를 속박하는 조항들이 담겨 있었다. 이는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다.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했던 시절부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업계의 약탈적 계약 문화가 낳은 필연적인 비극이었다.
출판사는 계약을 무기로 창작자를 배제했고, 신의를 저버렸다. 이 비극적인 선례는 지금의 웹툰 작가들에게도 생생한 공포다. 웹툰노조가 카카오엔터 매각 소식에 교섭을 서둘렀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신아 웹툰노조 위원장은 "매각이 되면 2차저작권 계약을 카카오 독점으로 한 작가들은 모두 헐값에 사모펀드의 ‘재산’이 되어 버린다"며,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없이 수천 개의 구름빵이, 수만 개의 검정고무신이 생겨날 게 뻔했다"고 당시의 절박함을 토로했다. 과거의 비극이 현재의 위협으로 직결되는 구조인 것이다.
절벽을 오르는 사람들: 존재를 부정당한 목소리
카카오엔터가 보낸 "당신들은 근로자가 아닙니다"라는 답변은 웹툰 작가들이 처한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플랫폼은 작가들을 독립된 '사업자'로 규정하며 노동법의 보호망 밖으로 밀어내고, 교섭의 의무를 회피한다. 하지만 이는 웹툰노조가 수년간 맨몸으로 절벽을 오르며 예상했던 답변이기도 하다.

하신아 위원장에 따르면, 노조의 투쟁은 처음부터 치밀한 전략 위에 세워졌다. 아무도 테이블에 나오려 하지 않을 때, 국정감사라는 사회적 무대를 활용해 플랫폼 대표에게 "작가들과 대화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 '첫 번째 피켈'이었다. 이후 문체부의 '상생협의체'에서 졸속으로 처리되려던 협약서에 맞서 싸우며 실질적인 논의를 이끌어낸 것은 '두 번째 피켈'이었다. 이 모든 과정은 "너희들은 이미 우리와 실질적인 교섭을 했다"는 명분을 쌓는 과정이었다.
이들이 요구하는 '교섭'의 의미는 거창하지 않다. 하 위원장은 과로로 쓰러진 작가의 휴재 공지에 으레 붙는 "작가님의 사정으로"라는 문구를 예로 든다. 모든 책임이 작가 개인에게 전가되는 현실 속에서, 교섭은 그 말풍선의 주어를 '회사'에서 '우리'로 바꾸는 최소한의 절차다. 하신아 위원장은 노동의 가치를 당사자들이 평등하게 정하자는 상식적인 약속이라고 설명한다.
두 개의 생태계, 하나의 뿌리
플랫폼은 K-웹툰의 성장을 이끈 '창작 생태계'의 조성을 자랑한다. 반면 노조는 그 이면의 '노동 생태계'가 썩어가고 있다고 외친다. 하지만 하 위원장의 말처럼 "결국 두 생태계는 같은 나무의 뿌리와 줄기다. 뿌리가 썩으면 열매는 금세 시든다." 창작자의 노동 환경이 무너지면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뿌리(작가)의 건강 검진(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나무(산업) 전체를 병들게 하는 어리석은 행위다.
'검정고무신' 사태와 웹툰노조의 투쟁은 결국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다. 창작자의 노동자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표준계약서를 안착시키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창작자를 소모품이 아닌 파트너로 인정하는 산업 문화의 전환과 창작자들의 연대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절실하다.
다음 컷의 콘티를 짜는 사람들
故 이우영 작가의 눈물은 과거의 아픔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 그 비극 위에서, 웹툰 작가들은 이제 연대라는 이름으로 다음 컷의 콘티를 짜고 있다. 그들의 싸움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넘어, K-콘텐츠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회의실 긴 테이블 한가운데 놓인 종이 위에, 굵은 사인펜으로 '제1조(적용 범위)'라는 활자를 함께 적는 장면.
웹툰 작가들이 꿈꾸는 이 장면은 한국 만화·웹툰 산업이 더 건강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그려내야 할 '첫 컷'이다. 플랫폼과 정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 처절한 데드라인 앞에서 이제 응답해야 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