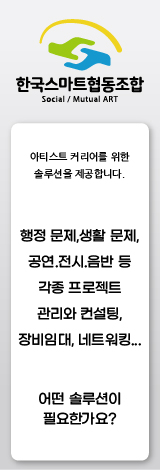미술평론가 최석태 |

길쭉길쭉하게 생긴 남자가 바닷가 언덕에 한 다리는 꿇은 모습으로 다른 한 다리는 무릎을 세우고 앉아 있다. 팔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꺾어지지 않고 굽어지기만 하는 이상한 팔이다. 왼팔은 머리 위로 올려, 나뭇가지임이 분명한데 팔처럼 채색된 무언가와 맞잡은 모습이다. 남자의 팔과 마찬가지로 나무 가지도 구부러져 있다. 둥글게 휘어진 문처럼 보이는 오른쪽 팔도 나무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고 보면 오른쪽 팔에는 손이 없다.
남자 뒤로 보이는 여자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틀어 시선을 화면 밖 어딘가로 향하여 헤매는 듯하다. 저 여인을 팔로 만든 문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것일까? 머리 위로 올려 나무 가지와 맞잡은 손과 달리 문을 만든 오른쪽 팔은 나뭇가지와 완전히 하나가 된 듯 손가락 흔적도 없다. 그래야 여자가 이곳으로 들어오리라! 그 문 아래, 남자의 발끝과 나무 밑둥치 아래에는 꽃잎이 놓여있다.
그림에 보이는 선이나 형태는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하고 자유로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양식은 이제 널리 알려졌듯이, 보통은 아르누보라고 하는 양식을 따른 것이 분명하다. 아르누보가 처음 등장했을 때 벨기에에서는 이 양식을 경멸하는 의미로 '장어 양식' 혹은 '국수 양식'이라고 했지만, 이 말은 아르누보 양식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이름이기도 하다.
아르누보는 고사리 같은 식물의 싹이나 덩굴 혹은 꽃 같은 자연물이 보여주는 선을 본뜬 것이다. 이 양식은 건축이나 공예 같은 생활 미술에서 더욱 애용되었다. 산업혁명이 낳은 대량 생산이 주는 차가운 획일성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태도, 사진이 발명되면서 미술은 더 이상 재현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발생하여 유행한 양식이다. 탈인상주의 혹은 후기인상주의의 대표자 중 하나인 반 고흐의 말년 작에서도 강력하게 나타나고, 에드바르트 뭉크의 그림에서도 자주 구사되었다.
아르누보라는 단어는 프랑스어로 새로운 미술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불렀고, 독일어권에서는 젊음, 청춘 양식이라는 뜻으로 '유겐트 슈틸'이라고 했다. 별도의 우리말 옮김이 아직 없다. 에스파냐어권에서는 다소는 막연한 '근대양식'이라는 용어를 채용했으나 위대한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1852-1926)의 놀라운 건축을 떠올리면 단박에 이해될 것이다.

아르누보 그림으로는 지금은 체코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나고 자라고 프랑스에서 활동한 알퐁스 뮤샤(1860-1939)가 널리 알려졌다. 이 양식의 선구자는 아니지만 이 양식으로 대성한 사람이다. 이번에 소개하는 이중섭의 그림에 나타나는 아르누보 양식은 1890년과 1905년 사이에 유행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양식의 대표 작가 중 하나인 뮤샤가 사망한 해는 그로부터 한참 뒤인 1939년이다. 이중섭은 이와 거의 같은 시대에 이를 활용한 것이다.

아르누보 양식은 재현을 넘어 대상의 모양을 자유자재로 변형하면서 색채의 자율성과 더불어 화면의 자율성을 높여서 심리 표현의 영역까지도 가능하게 하여 미술의 변모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중섭의 스승 임용련에게서 약간의 징후가 있었고, 이중섭에게서는 이 그림을 비롯하여 이후로 이어지는 엽서 그림 몇 점에서 드러날 뿐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아르누보 양식은 이후 잡지의 삽화나 건축에서 좀 더 활발하게 이용되었다. 이런 점에서 이중섭의 이 그림은 아주 작은 크기의 그림이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성이 있다. 이중섭이 동서고금을 아우르는 세계미술을 호흡한 미술가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그림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전면에 배치된 나무는 분위기를 압도한다. 이중섭 본인으로 여겨지는 남자와 나무만이 유기적인 선을 띠고 있다. 그 바로 뒤에 그려진 여자는 마치 숨기고싶어 하는 듯 다른 양식으로 그려졌다. 양식이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대충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전경의 남자, 나무, 그리고 여자 같은 소재들을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것은 화면 중간 부분의 바다물에 칠한 짙은 청색이다. 화면 아래 땅에 해당하는 둥그런 부분과 바다가 끝나는 위로 펼쳐진 하늘은 아무 색도 칠하지 않았다. 보는 사람이 눈길은 자연히 그 면적에서나 색채에서나 대비가 심한 가운데 부분으로 쏠리게 된다.
이 그림 역시 이미 그려진 그림을 먹지에 대고 옮겨 그렸다. 이중섭의 첫 엽서 그림 <바다에서 일어난 신기한 일>(관련 기사 감추어진 마음, 이중섭의 연애 엽서)과 같은 방법이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똑같이 먹지를 대고 그렸지만 유려한 곡선을 자유자재로 그었다는 것이다. 이 그림이 아르 누보 양식을 채택하여 이채롭다는 것을 넘어서서, 좋은 그림이라고 판단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시원스럽게 얽혀 있는 나무와 남자가 이루는 곡선이 마치 춤을 추는 듯하지 않은가!
엽서에 그린 그림의 제목은 필자가 처음 붙였다. 남자는 주인공인듯 화면 전면에 배치했고, 여자는 조연으로 의도한 듯하였기 때문에 <여자를 기다리는 남자>라고 이름지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어디까지나 남자 이중섭이고, 이 그림을 볼 대상이 여자 마사코니까.
그림 아래에 두 줄로 적힌 이름과 제작 연도가 있고 그 앞에 마사코의 “마사”를 적었기 때문에 그림의 제목을 '마사'라고 한 경우도 있으나, 바로 며칠 전에 그려 보낸 그림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었으니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지난 2016년, 이중섭 탄생 10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공공미술관에서 연 국립현대미술관 이중섭전에서는 제목을 “남자와 여자”라고 했다. 과연 어느 제목이 더 알맞은지 이 글을 읽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싶다.